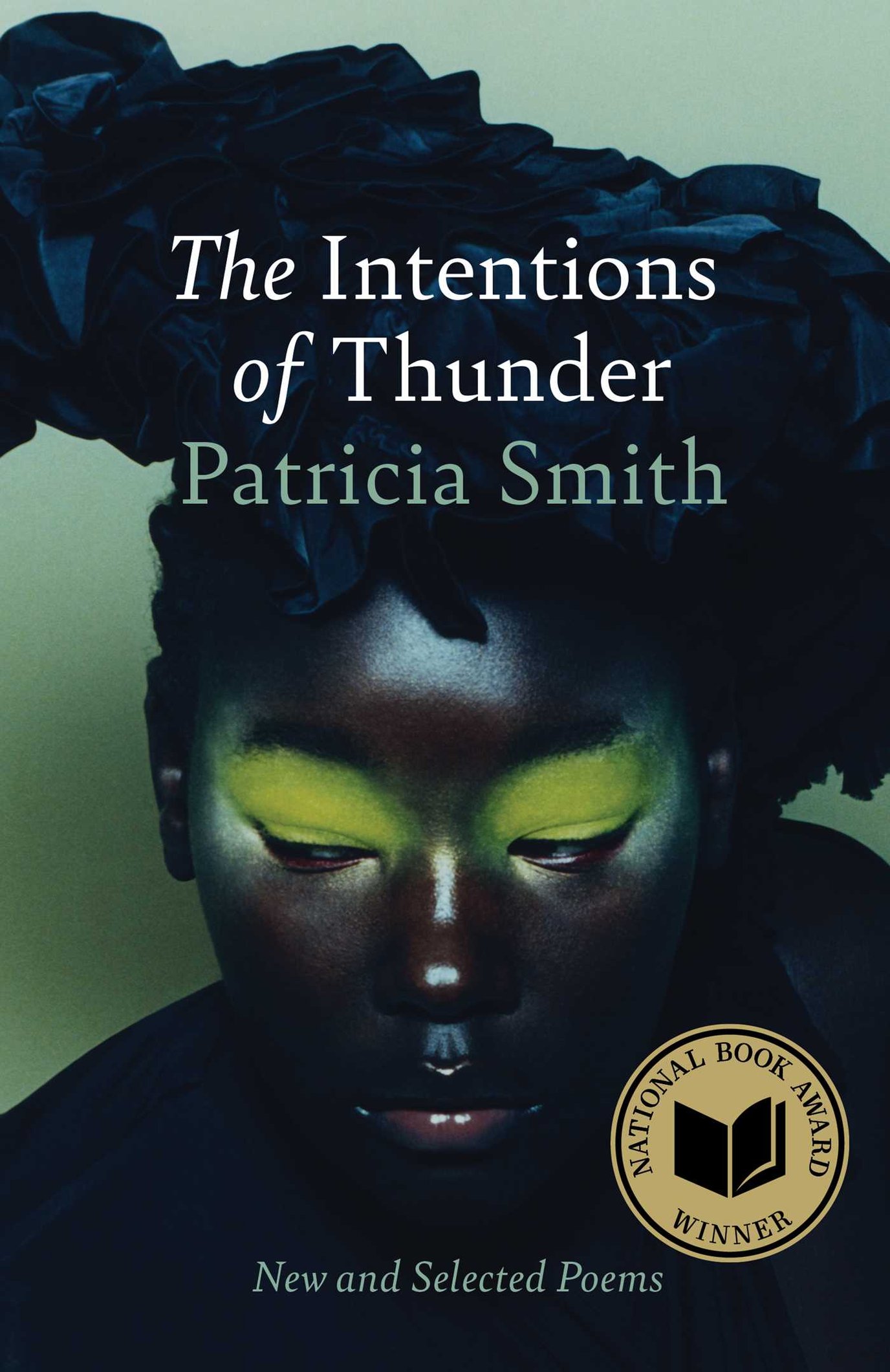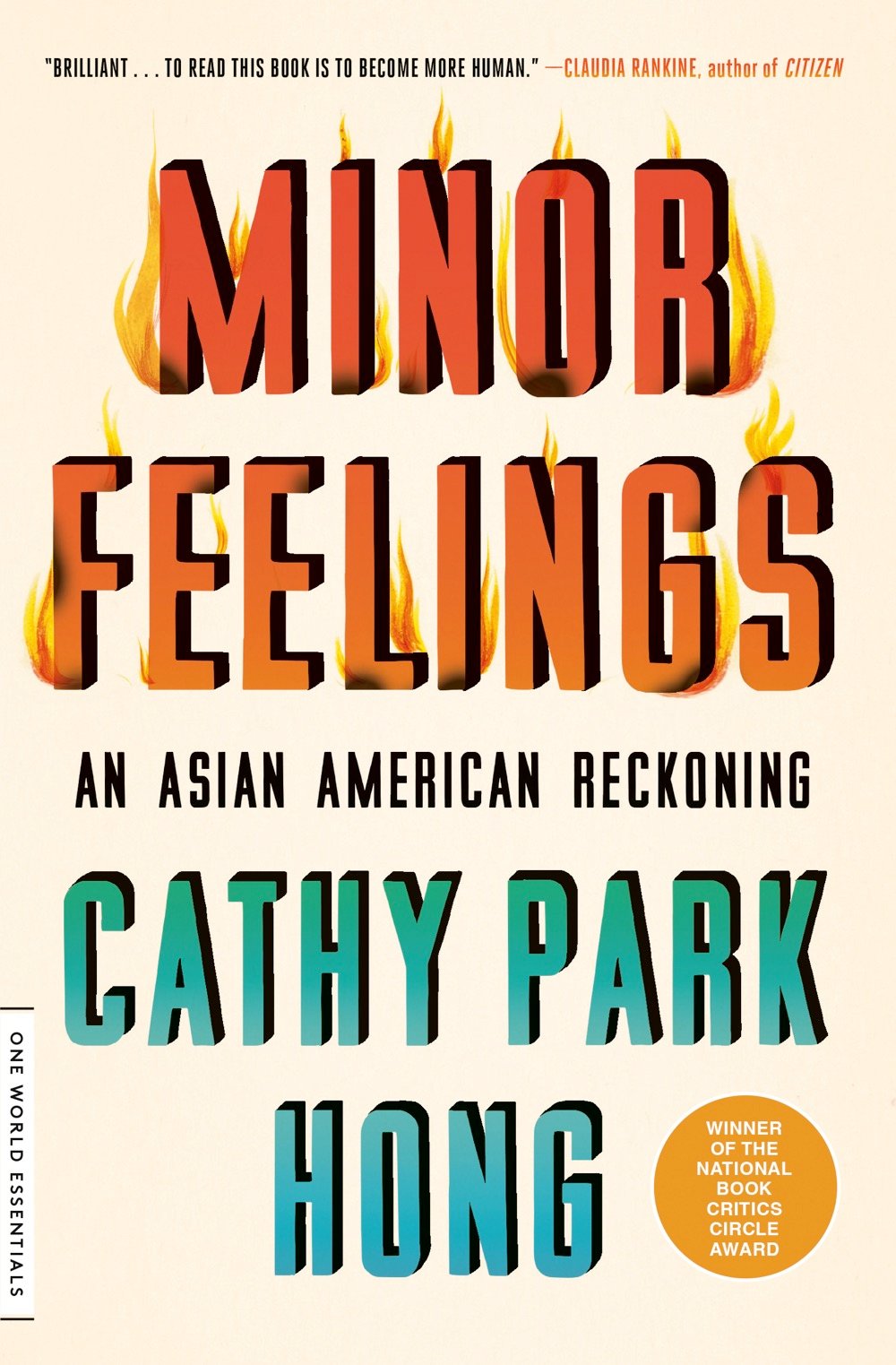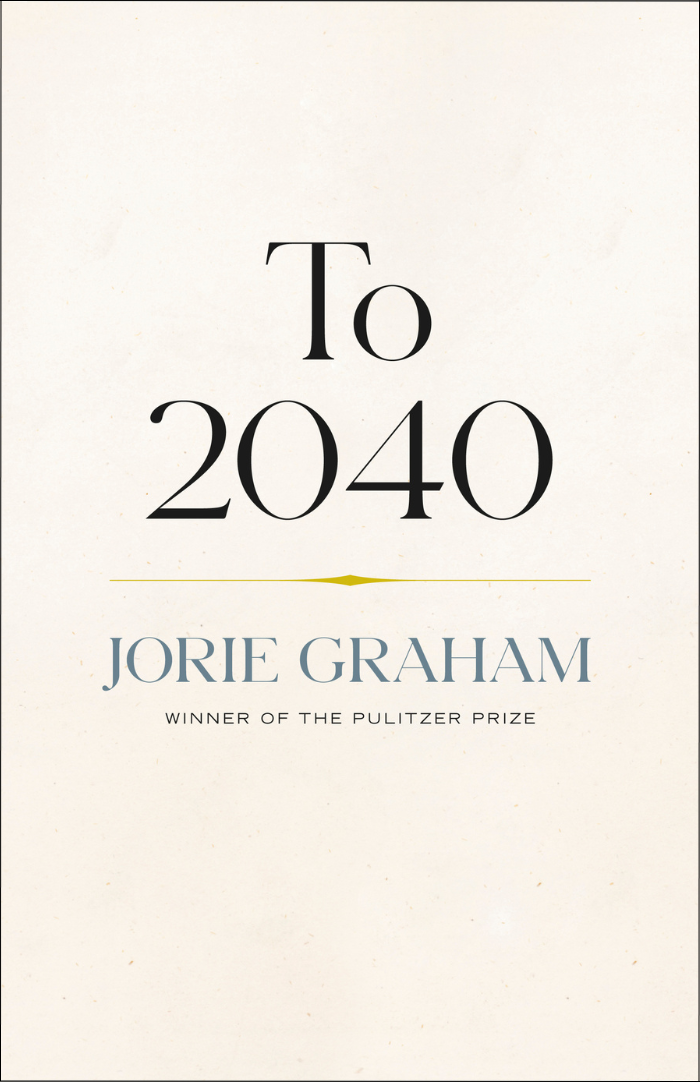
조리 그레이엄의 시집 <2040년에게> 표지. /사진제공=Copper Canyon Press
2024.10.11 14:26
- 0
미래를 그려내는 서사는 보통 글을 쓰는 현재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시간적 지점을 내다보는 경우가 많았다. 1895년에 간행된 H. G. 웰스(H. G. Wells)의 <타임머신>(The Time Machine)은 80만 2701년이라는 엄청난 미래로의 시간 여행을 보여 주며, 심지어 소설의 후반부에서는 3000만 년 후로까지 상상력을 확장해 간다. 또, 1932년에 발표된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는 약 600년 후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반면에, 가장 유명한 디스토피아 소설인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는 1949년에 쓰여졌으니 35년 후라는 비교적 근접한 미래를 그려낸 셈이다. 마가렛 애트우드(Margaret Atwood)의 <시녀 이야기>(The Handmaid's Tale) 역시 1985년의 시점에서 약 15년 후의 미국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간다. 이런 소설들에 이어서, 머나먼 미래가 아니라 곧 도래할 세상을 상상하는 '근미래' 소설이나 영화가 최근 들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급속하게 파괴되는 자연환경,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그리고 세계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전쟁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의 양상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키고 말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대 시단을 대표하는 중요한 시인 중 한 사람인 조리 그레이엄(Jorie Graham)이 2023년에 발간한 시집에는 <2040년에게>(To 2040)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20년도 남지 않은 가까운 미래의 시점을 바라보는 노시인의 목소리에는 주로 죽어가는 생태계에 대한 절박한 우려가 담겨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희망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 그레이엄은 시라는 장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 권의 시집 속에 조금씩 다른 비전을 담은 시들을 배치함으로써 인류의 실천적 선택에 따라 미래의 세계가 복수형의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조리 그레이엄 - 시 (번역: 조희정)
땅이 말했다
나를 기억하라고.
땅이 말했다
놓아버리지 말라고,
어느 날 말했다
내가 우연히
듣고 있었을
때에. 나는
그것을 들었고, 마치
체온처럼 그것을 느꼈다,
속삭임으로 말해진
모든 것을—내일을 만
들어, 옳은 일이 일어나
게 해, 너는 자유롭지
않아, 다른 상황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시간은 다 채워지지 않았어,
시간은 늦지 않았어, 그 텅 빈 곳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있어, 마치 네가 텅 빈 곳을
필요로 하듯이, 그것은
빛을 꺼려 다시 또
다시, 비록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어도, 하루에
하나의 사실, 활
모양을 그려 완벽한
연산을 뒤틀어
버리는 새 한
마리, 저녁 대기
속에서 세찬 바람 타고서
실수 없이, 다시 또
다시 지나
가고—네 무
심함이 네 주요한
아름다움이야
정신이 항상 말
하지—나는 들어—나는
들어 모든
곳에서. 땅은
말한다 나를
기억하라고. 나는
땅이야 그것은 말한다. 나
를 기억해 줘.

시인 조리 그레이엄. /사진=Mariana Cook
2020년에 발표된 이 시는 <2040년에게>에 담겨 있는 시인의 긴급한 문제의식을 예고해 준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생태 시학을 펼쳐 온 그레이엄은 고요함 속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땅이 말했다"로 시작되는 첫 구절부터 시인은 자연과의 밀접한 교감을 느꼈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인이 "땅"과 소통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이나 "우연히"라는 어구들이 표현해 주듯이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얻게 된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오히려, "나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놓아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땅"의 목소리는 예상치 않았던 순간 시인의 귀에 불쑥 들려온다. 그레이엄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소통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속삭임"에 최대한 반응해야 할 필요성이다.
"땅"의 말을 듣는 청각적 경험은 "체온처럼 그것을 느끼는" 촉각적 경험으로도 이어진다. 인간의 감각 중 촉각만큼 대상과의 밀착을 강하게 전제하는 것이 없기에, 이 표현은 "땅"과 시인이 그만큼 가까운 관계를 형성했음을 전해 준다. 그 "속삭임"을 제대로 듣기 위해 최대한 "땅"에 근접하다 보면 "땅"이 내뿜는 온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체온"(temperature)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열"이 날 때 사용되는 것이기도 해서, "땅"의 온기는 현재 지구 환경 변화의 가장 심각한 지표인 '온난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듯 생각되기도 한다. "땅"은 이미 열병에 걸려 있는 상태이며, "나를 기억하라고", 또 "놓아버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심각한 상황을 부디 인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직 "시간은 다 채워지지 않았고"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땅"은 부디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한다. 이 속삭임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면 "옳은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할 텐데,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땅"은 인간이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텅 빈 곳"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연 속 미지의 공간이 "빛을 꺼린다"고 말한다. 이 다소 모호한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빛"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텅 빈 곳"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앎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자연의 거대한 힘을 존중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사실,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연산"은 "활 모양"을 그리는 "새 한 마리"의 날갯짓이 "뒤틀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취약한 것이 아닐까?
그러하기에, "땅"을 향해 "네 무심함이 네 주요한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정신"은 진지한 반성적 성찰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자연은 단순히 인간의 삶이 진행되는 뒷면에 있는 무심한 배경이 아니며, 그렇다고 인간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미적 감상의 대상도 아니다. "땅"이 열병을 앓으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역으로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인류의 활동은 "땅"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인간과 자연은 하나로 묶여 있기에, 그레이엄은 "땅"이 들려주는 "나를 기억해" 달라는 메시지를 인류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절실한 사명감을 드러낸다.
어쩌면, 이 시의 제목이 '시'(Poem)라고 붙여져 있는 이유도 그레이엄이 생각하는 시, 그리고 시인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짐작된다. 이 시에서 시인은 인간 주체로서 스스로의 감정과 인식을 표현하는 것에서 잠시 벗어나 마치 복화술사처럼 자신이 들은 "땅"의 속삭임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 이런 시인의 노력을 매개로 "땅"을 기억하고 공존의 내일을 건설해 가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 어디에선가 시작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레이엄이 생각하는 '시'의 사명이 충실하게 열매 맺는 순간일 것이다.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이 기후 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학자들의 예상처럼, 2040년의 세계는 그런 실천들의 유무와 향방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문: Poem
The earth said
remember me.
The earth said
don't let go,
said it one day
when I was
accidentally
listening, I
heard it, I felt it
like temperature,
all said in a
whisper—build to-
morrow, make right be-
fall, you are not
free, other scenes
are not taking
place, time is not filled,
time is not late, there is
a thing the emptiness
needs as you need
emptiness, it
shrinks from light again &
again, although all things
are present, a
fact a day a
bird that warps the
arithmetic of per-
fection with its
arc, passing again &
again in the evening
air, in the pre-
vailing wind, making no
mistake—yr in-
difference is yr
principal beauty
the mind says all the
time—I hear it—I
hear it every-
where. The earth
said remember
me. I am the
earth it said. Re-
member me.
조희정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하버마스의 근대성 이론과 낭만주의 이후 현대까지의 대화시 전통을 연결한 논문으로 미시건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간과 자연의 소통,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 독자와의 소통, 텍스트 사이의 소통 등 영미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