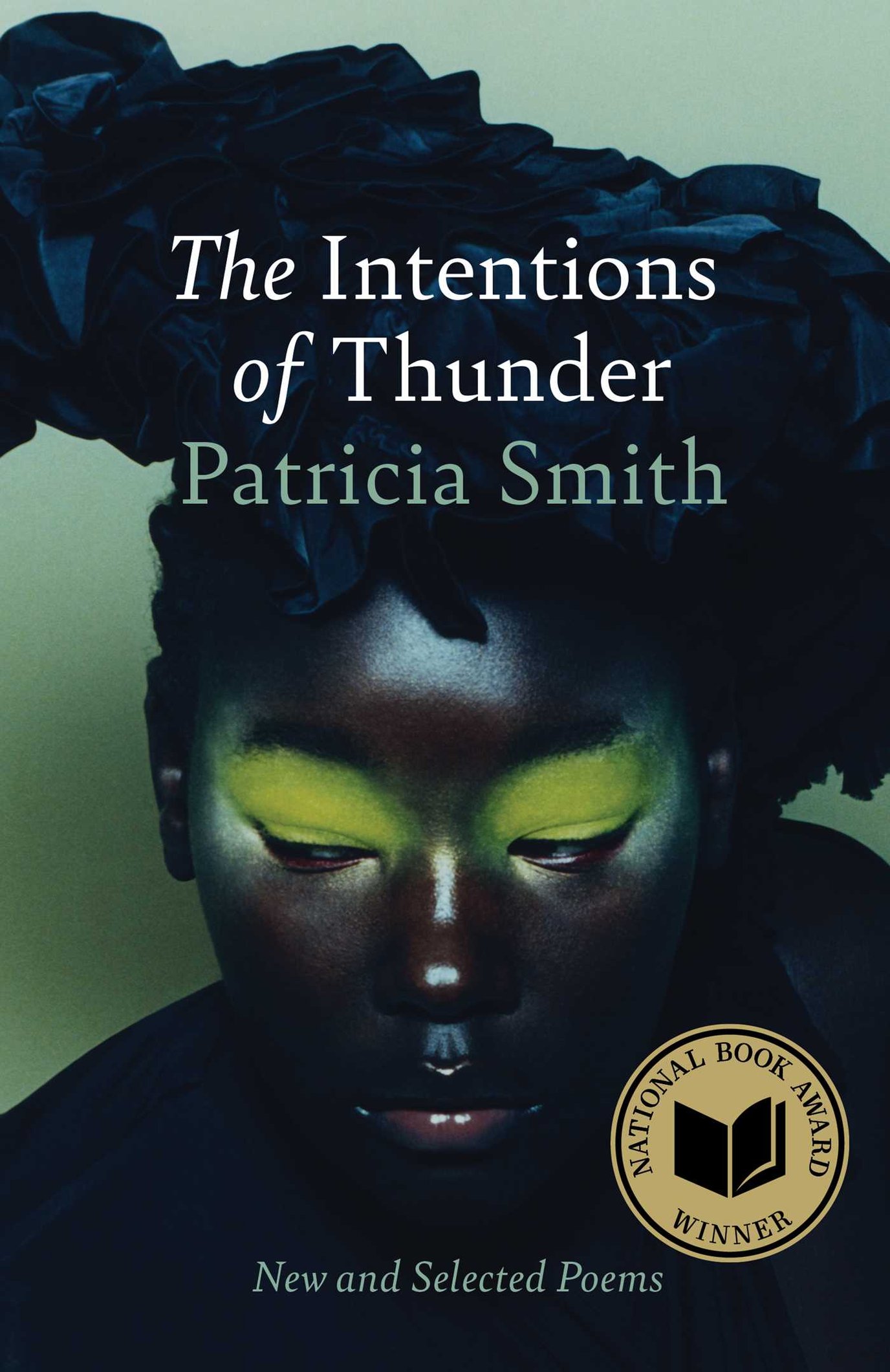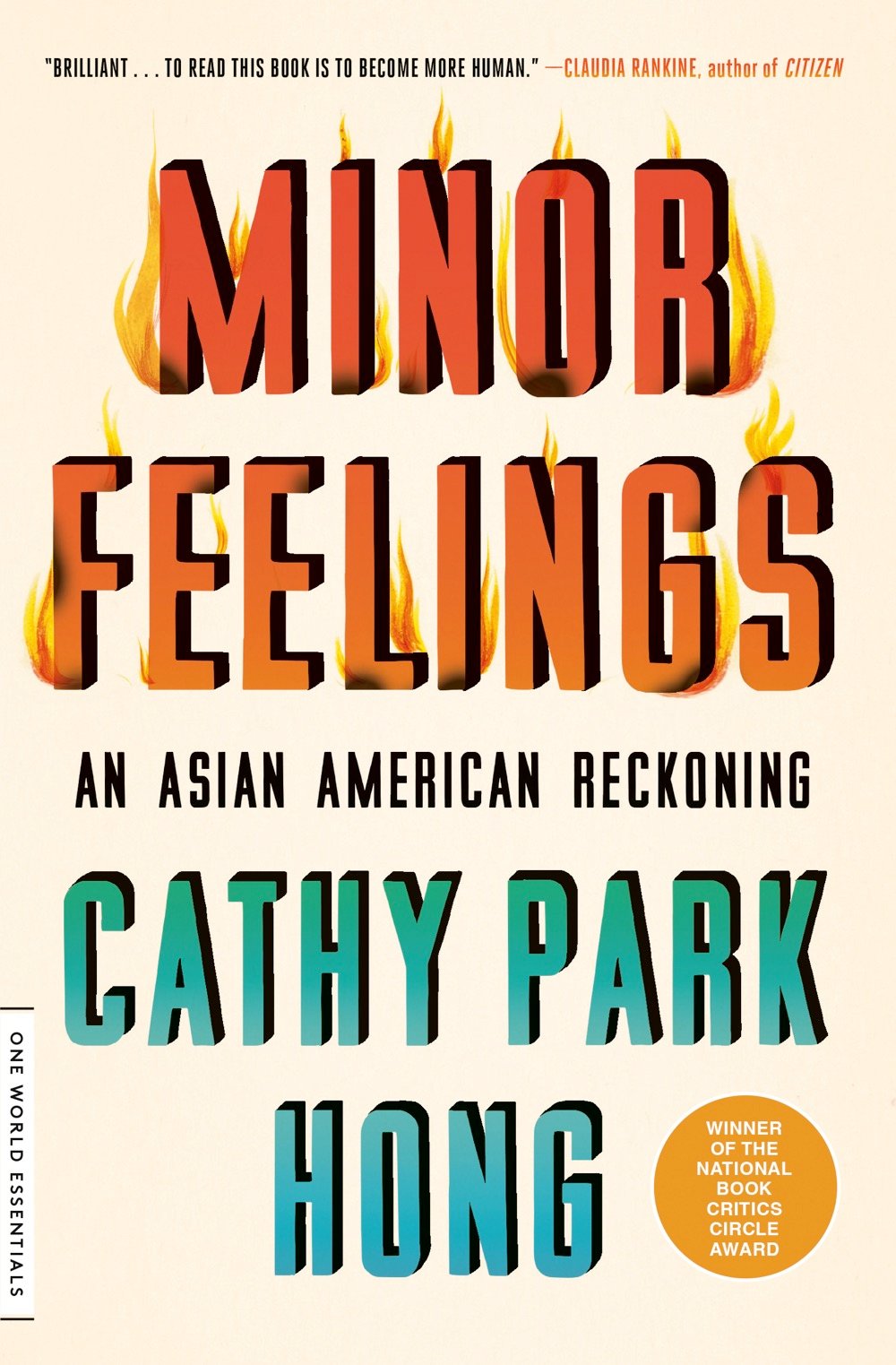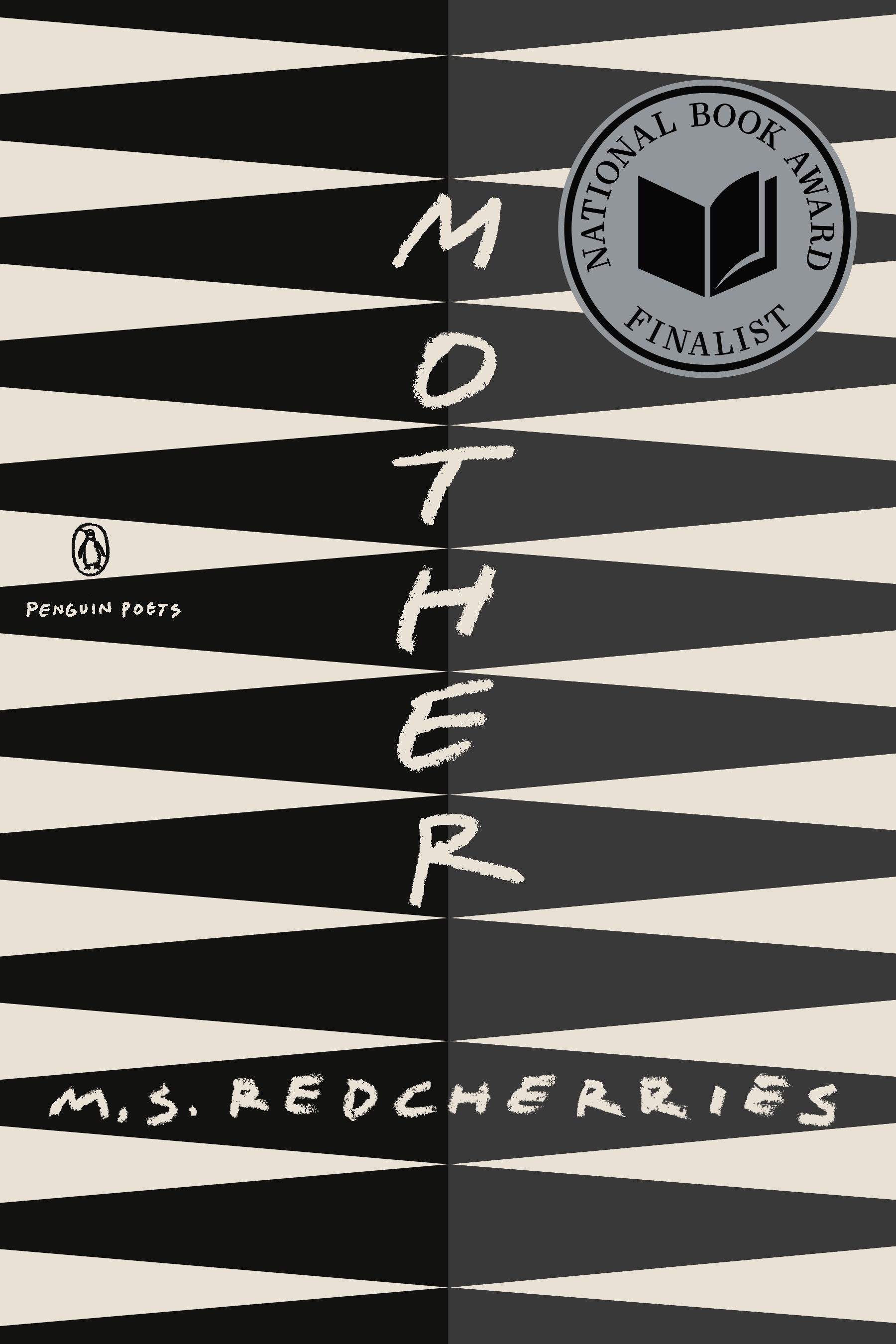
m.s. 레드체리즈의 시집 <어머니>(2024) /사진제공=Penguin Random House
2025.04.25 14:41
- 0
태어나서 쭉 살아오던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공간에 홀로 던져질 때, 인간은 누구나 정체성의 혼란을 어느 정도 겪게 마련이다. 개인이 적응해야 할 그 나름의 규범과 문화가 있는 세계에서 적당히 융화되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자신이 몸담았던 공동체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억눌러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이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예전의 삶은 단절된 머나먼 세계의 일로 느껴지게 되면서 점점 지워지게 되고, 현실을 살아가다가 가끔 꿈결처럼 떠오르는 몇 가지 기억의 조각들만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매개로 남아 있게 되기도 한다. 더구나, 개인이 진입한 새로운 세계가 앞으로의 삶에서 주요한 터전이 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과업이 숙제처럼 던져져 있는 경우, 예전에 몸담았던 공동체의 흔적은 더더욱 희미해져 가게 된다.
최근에 주목받는 미국 시인들을 살펴보면 그 중 상당수가 소수인종 출신이고, 이들의 시에서는 미국의 주류 문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고뇌가 자주 드러난다. 특히, 여러 소수인종 중에서도 미국 원주민들의 경우 정체성을 둘러싼 문제들이 개인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드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 원주민들은 다른 어떤 소수인종보다도 문화적인 고정 관념(stereotype)의 강력한 영향을 감수하며 살아가게 된다. 머리의 깃털 장식,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자연과의 마술적인 교류 등 '인디언'이라는 단어와 결부되는 수많은 이미지는 아직도 큰 위력을 잃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만 해도 570여 부족으로 존재하는 미국 원주민들은 일반화하기 어려울 만큼 제각기 다른 생활 양식을 지닌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기에, 이들이 그 공동체 밖으로 나왔을 때 느끼는 이질감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m.s. 레드체리즈(m.s. RedCherries)의 2024년 시집인 <어머니>(Mother)는 미국 원주민의 정체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들의 서술자(narrator)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부족을 떠나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되어 성장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과거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어머니'로 대표되는 가족 구성원들은 대화를 통해 그녀에게 그간 잊고 살아온 공동체의 유산을 전달하고, 그녀는 그 이야기들을 엮어 가면서 과거 자신이 태어나서 자랐던 가족의 역사를 다시 써 간다. 이 과정은 결코 매끄러운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갈등과 긴장으로 울퉁불퉁하며, 전통적인 시 형식보다 산문에 가까운 불연속적 조각들로 이어져 있다. 시인의 진솔한 언어는 시집 전체를 통해 두 이질적인 세계 사이를 오가는 개인의 힘겨운 여정을 매우 실감 나게 그려내 준다.
m.s. 레드체리즈 - 내일을 찾는 것 (번역: 조희정)
인디언들은 그들끼리 내버려두길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길 원하지는 않는다고들 했지. 자라면서 단 하나뿐인 인디언이라는 것, 학교에서, 마을에서, 그 주의 동쪽 절반에서, 역사 교과서를 펼치면 "진짜" 인디언들이 천막1 옆에 있는 강에서 목욕하기처럼 "진짜" 인디언다운 행동을 하는 그림을 보는 곳에서, 그리고 네 급우들은 너에게 물어보지, "너도 저렇게 해?" 그러면 나는 스스로 묻지-내가 그래야 하나?-또 고등학교의 마스코트가 인디언들인 곳에서, 그러면 너는 세상에 유일한 진짜 인디언인 것처럼 느끼게 되지, 마치 네가 떠나온 그곳이 절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너는 그곳이 존재한다는 걸 알지 왜냐하면 거기가 너의 가족이 사는 곳이니까-그리고 크리스마스마다 너는 전화로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가족들은 너에게 고향 얘기를 해 주지-그리고 너는 물어보지
어머니
내 안 어디에 인디언이 있는 것인가요?2
시인은 "인디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를 시작한다. "그들끼리 내버려두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원주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마치 이들이 뭔가 이중적인 속성을 지녔다는 듯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는 듯하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은 욕망도,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 연결망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싶지 않은 욕망도, 사실 어디까지나 매우 정당한 것일 텐데, 이 둘은 쉽게 양립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된다.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시인은 미국 원주민 공동체 속에서의 정체성과 주류 사회에서 새로이 체득한 문화 사이의 갈등이 이 시 전체를 관통하는 것임을 소개하고 있다.
"학교"에서, "마을"에서 단 하나뿐인 인디언으로 살아가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주의 동쪽 절반"에서도 아예 찾아보기 어려운 소수인종으로서 외로이 삶을 개척해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도전일까? m.s. 레드체리즈는 몬태나(Montana) 주에 있는 노던 샤이엔(Northern Cheyenne) 인디언 보호지역 출신이지만, 어머니의 선택으로 텍사스(Texas)에 있는 한 가정에 입양되어 자라났다. 시인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쉽지 않은 '자라남'의 경험은 특히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 "학교"를 주된 배경으로 하여 전개된다. "역사 교과서"를 펼치면 자신과 같은 소수인종인 인디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천막"을 치고 살면서 그 옆에 있는 강에서 목욕을 하는 "진짜" 인디언들의 그림은 사춘기 소녀가 동질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낯설기만 하다. "진짜"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강조되어서 "인디언"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이 정말 인디언이 맞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소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안 그래도 두 세계 사이의 간극을 경험하며 혼동을 느끼는 사춘기 소녀에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소위 '전형적'인 인디언의 모습은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공동체에서 보았던 것과는 그다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그림을 보며 "너도 저렇게 해?"라고 묻는 급우들의 질문은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부정하고 허구적인 "진짜" 인디언의 정체성에다 그녀를 끼워 맞추어 이해하려는 폭력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보통 동물들이 등장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마스코트"로 인디언이 깃발이나 티셔츠에 그려진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 그만큼 미국 원주민들이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주변 친구들에게 그렇게나 대상화되고 타자화되어 있는 인디언의 모습에 소녀는 스스로를 투영시키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며, 그럴수록 정체성의 혼란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간다.
결국, 이런 혼란 속에서 소녀가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은 실재하는 인디언의 세계,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바로 그 곳에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가족들로부터 "고향"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고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묻는다. "내 안 어디에 인디언이 있는 것"인지를 말이다.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나면서 미국 원주민 공동체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체현하지 않아도 그녀는 인디언인 것일까? 인디언이라는 정체성은 대체 무엇을 통해 규정되는가? 단순히 그녀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미국 원주민 부모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인디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시는 이런 일련의 무거운 질문들을 던지고는 그에 대해 특별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의 제목이 '내일을 찾는 것'이라 붙여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질문들의 답을 찾는 과정이 시인에게는 미래가 펼쳐지는 모양새를 결정해 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인이 시집 전체를 통해 호명하고 시집의 제목으로 선택한 상징적 인물은 다름 아닌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미국 원주민 가정과 공동체의 언어와 문화를 체현하면서 시인이 앞으로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갈 때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 현대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인디언 문화의 전통을 감싸안을 수 있는 유연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레드체리즈는 우선 "어머니"와의 유대와 밀착된 관계를 통해 과거를 되살림으로써 그녀의 "어머니"처럼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미래를 여는 것은 결국 과거를 기억하고 증언하며 재구성하는 작업과 언제나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원문: finding tomorrow
It has been said that Indians want to be left alone, but never actually be alone. Growing up and being the only Indian in your school, in your town, in the eastern half of your state, at a place where you open a history textbook and see pictures of "real" Indians doing "real" Indian things, like bathing in rivers next to a teepee, and your classmates ask you, "do you do that, too?" and I ask myself—should I?—and where your high school mascot is the Indians and that makes you feel like the only real Indian in the world, like the place you were from never existed.
But you know it exists because that is where your family lives—and every Christmas you talk to them on the phone and they tell you stories about home—and you ask
mother,
where is the Indian in me?
조희정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하버마스의 근대성 이론과 낭만주의 이후 현대까지의 대화시 전통을 연결한 논문으로 미시건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간과 자연의 소통,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 독자와의 소통, 텍스트 사이의 소통 등 영미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