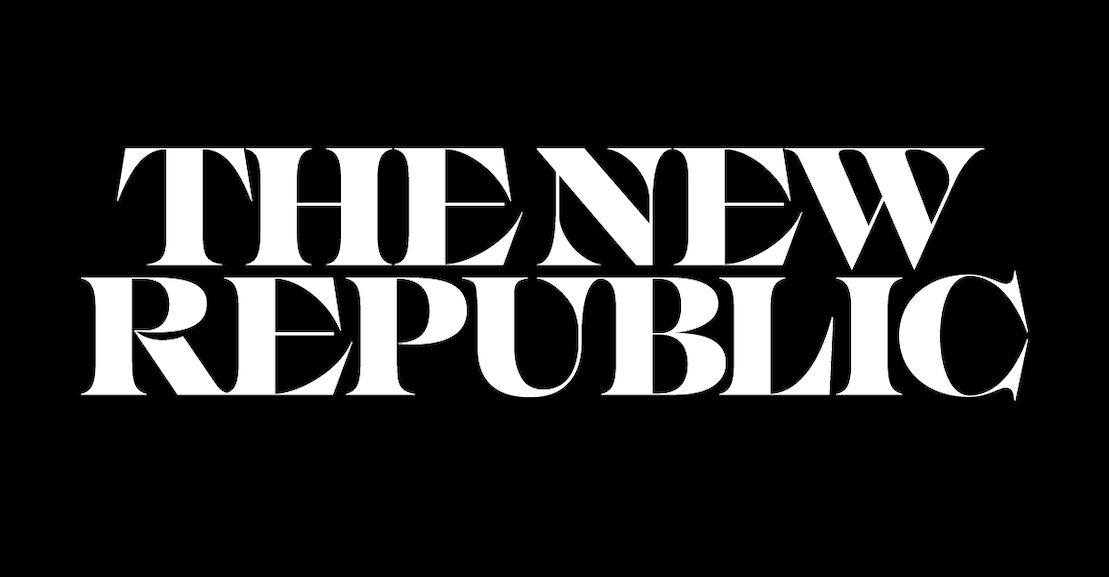1914년 창간된 미국의 진보 성향 매거진으로 본래 주간지였으나 현재는 월간지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 기사 수, 총 2건
대표 기사
에세이
테크
AI, 그리고 인간 작가의 종말
글쓰기에서 지독하게 싫으면서도 중독적인 요소는 불확실성이다. '이 글을 누가 읽을까?' 또는 '이 글을 써서 월세는 마련할 수 있을까?'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확실성이란 바로 글을 쓰는 행위 자체에 있는 불확실성이다. 에세이를 쓰는 직업을 생각해보자. 만 개의 가능성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보이지도 개념화되지도 않은 만 개의 가능성 중에서 처음 포착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모른 채 어떤 실을 잡아당기고, 어떤 실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 이러한 과정에서 무슨 아이디어를 골라내 다듬고 주물러서, 이름도 모르는 독자 앞에 내놓아야 할까? 하나의 문장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오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인지, 심지어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리한 관찰자라면 내가 글쓰기의 본질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작가의 오랜 특권이다. 작가는 작가의 고유성이라는 안전망 속에서 이런 불평을 토로해왔다. 글쓰기에 대해 불평하는 작가가 아니라면, 누가 글을 쓰려고 했겠는가?
The New Republic
![icon]() 12min
12min
![icon]() 0
0
정치
에세이
서평
해적과 민주주의
바다에서 싸움을 한바탕 치른 후 그렇게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역사적으로 해적 '경제' 연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문제이다. 먼바다 해적의 황금기인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going on the account"로 종종 불렸던) '해적질'에 대한 신화와 이야기는 항상 약탈과 추격전, 수평선에 검은 깃발을 발견했을 때 상선 선원들이 느끼는 공포, 씻지 않아 목에 땟국물이 흐르는 거친 선원들과 무자비한 선장들에 대한 드라마 같은 것이었다. 사실 해적의 이야기는 정직한 회계기록 보다는 허풍에 가까운 것이었다. 하지만 스페인 갤리온선을 나포해 해적선의 화물칸을 보석과 비단, 금화로 가득 채우고 난 이후 해적선장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 해적들에게도 유동성 확보는 어려운 문제였다. 막대한 양의 귀중품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적들은 부패한 식민지 관리가 눈감아주지 않는 경우, 제국의 손길 닿지 않는 곳에 있는 해적 소굴을 통해 배에 물과 식량을 다시 싣고, 떠나는 선원들을 내려주고 새로 합류하는 선원을 싣고, 희귀한 보물을 깔끔하게 현금으로 세탁할 수 있었다.
The New Republic
![icon]() 12min
12min
![icon]() 0
0
전체 기사
예상시간 오름차순

정치
에세이
서평
해적과 민주주의
바다에서 싸움을 한바탕 치른 후 그렇게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역사적으로 해적 '경제' 연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문제이다. 먼바다 해적의 황금기인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going on the account"로 종종 불렸던) '해적질'에 대한 신화와 이야기는 항상 약탈과 추격전, 수평선에 검은 깃발을 발견했을 때 상선 선원들이 느끼는 공포, 씻지 않아 목에 땟국물이 흐르는 거친 선원들과 무자비한 선장들에 대한 드라마 같은 것이었다. 사실 해적의 이야기는 정직한 회계기록 보다는 허풍에 가까운 것이었다. 하지만 스페인 갤리온선을 나포해 해적선의 화물칸을 보석과 비단, 금화로 가득 채우고 난 이후 해적선장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 해적들에게도 유동성 확보는 어려운 문제였다. 막대한 양의 귀중품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적들은 부패한 식민지 관리가 눈감아주지 않는 경우, 제국의 손길 닿지 않는 곳에 있는 해적 소굴을 통해 배에 물과 식량을 다시 싣고, 떠나는 선원들을 내려주고 새로 합류하는 선원을 싣고, 희귀한 보물을 깔끔하게 현금으로 세탁할 수 있었다.
The New Republic
![icon]() 12min
12min
![icon]() 0
0
에세이
테크
AI, 그리고 인간 작가의 종말
글쓰기에서 지독하게 싫으면서도 중독적인 요소는 불확실성이다. '이 글을 누가 읽을까?' 또는 '이 글을 써서 월세는 마련할 수 있을까?'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확실성이란 바로 글을 쓰는 행위 자체에 있는 불확실성이다. 에세이를 쓰는 직업을 생각해보자. 만 개의 가능성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보이지도 개념화되지도 않은 만 개의 가능성 중에서 처음 포착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모른 채 어떤 실을 잡아당기고, 어떤 실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 이러한 과정에서 무슨 아이디어를 골라내 다듬고 주물러서, 이름도 모르는 독자 앞에 내놓아야 할까? 하나의 문장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오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인지, 심지어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리한 관찰자라면 내가 글쓰기의 본질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작가의 오랜 특권이다. 작가는 작가의 고유성이라는 안전망 속에서 이런 불평을 토로해왔다. 글쓰기에 대해 불평하는 작가가 아니라면, 누가 글을 쓰려고 했겠는가?
The New Republic
![icon]() 12min
12min
![icon]() 0
0